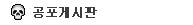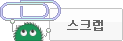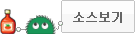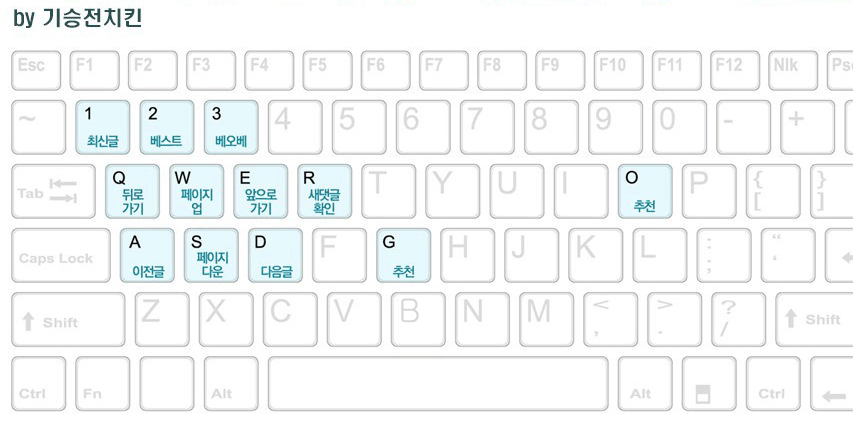<div style="text-align:left;"><img class="chimg_photo" style="width:284px;height:176px;" alt="bigstock-dark-spooky-forest-with-silhou-42225886-1024x552.jpg" src="http://thimg.todayhumor.co.kr/upfile/201608/1472305333483690efd7a74fcbba44e46944f8771f__mn719979__w1024__h552__f128648__Ym201608.jpg" filesize="128648"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left;"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left;"><strong>달빛이 내리는 오솔길</strong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left;"> <br>『보일 듯 말 듯 희미한 안개와, 향긋한 자연의 내음으로 뒤덮인 숲.<br>그 끝없는 검은 숲 위에 이어지는, 회색빛 하늘의 명암이 천천히 회전하며, 제 발밑을 쳐다본다.<br><br>천구의 가장 안쪽 껍질에 위태롭게 매달려, 밤이라는 심연의 시간 동안 잠든 생명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보름달과, 그런 그를 막아 세우는 구름이 가득 찬 하늘. <br> <br>그 잿빛 구름들을 뚫고 들어오는, 금색의 달빛은 길을 헤매며, 조금 더 흐릿하게 빛날 뿐이다.』<br> <br> <br> <br> <br> <br>그저 갑자기라고 할 수밖에 없이, 의식이 내 몸을 찾아왔다.<br> <br>이 숲에 나 혼자 서있는 것이 어쩐지 당연하게 느껴졌지만, 내 머릿속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.<br><br>내 이름도, 직업도, 나이도, 가족도,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.<br><br>그저 공허한 기억과 함께, 그림자의 색을 띠고 있는 이 검은 숲에 갇혀 있을 뿐이었다.<br> <br>난 본능적으로 내 몸을 내려다봤다. <br>아마도 내 의식이 최초로 보는 사람의 형상일 그 몸은, 자신의 몸뚱아리라고 하기엔 뭔가 낯선 느낌이 들었다.<br><br>그런 나의 몸 뒤로 이어지는 그림자는 한 개가 아니었다.<br> <br>내 그림자 옆에 서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, 그것은 하얀빛의 사람의 형상이었다.<br>나보다 작은 키에 소녀 같이 왜소한 체격을 가진 그것은, 미동도 하지 않으며, 내 뒤에 딱 달라붙어 날 따라오고 있었다.<br> <br>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귀신의 빛을 보고 혼비백산하며 도망갔을 테지만, 난 이 '하얀 그림자'로부터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못 했다.<br> <br>아니, 오히려 무언의 친근함, 애잔함이 느껴졌다.<br> <br>그 두 개의 감정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섞이며, 눈물과 미소를 부르는 역설적인 감정을 탄생시켰다.<br> <br>난 애써 그 오묘한 감정을 추스르며, 주위를 둘러봤다.<br> <br>이파리 하나 없는 검은 나무들과, 잿빛이 가득한 하늘,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희미한 달빛.<br><br>그 작은 금빛을 받으며 내 발밑에서 반짝이는, 고운 조약돌들은 마치 길을 알려주듯, 희미한 빛의 행렬을 저 멀리 이어 나가고 있었다.<br><br>거부할 수 없는 그 황홀한 이끌림에, 난 빛의 발자국을 따라, 이름 모를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.<br><br> <br> <br> <br> <br>어느 정도 걷자, 이성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다.<br>이어서, 그 빛나는 오솔길과는 대조적으로 장식되어 있는,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.<br> <br>가장 먼저 의식한 것은 메마른 가지만을 뻗치고, 썩은 검은빛을 발하는 나무들이었다.<br> <br>그것들은 어김없는 고목(枯木)의 모습이었지만, 그것들은 결코 죽어 있지 않았다. 분명히 살아 있는 식물이었다.<br><br>아니, 어쩌면 그것들은 식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.<br><br>사람의 손을 연상시키는 그 다섯 갈래의 가지를 이리저리 흔들어대며, 날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것들은 도저히 내가 아는 나무라는 생명이 아니었다.<br> <br>다행히 뻣뻣한 몸통 때문에, 그 저주받은 가지들은 내 키보다 높은 허공에서 의미 없게 허우적거릴 뿐이었다.<br> <br>그러나 그보다 두려운, 위협적인 존재는 따로 있었다.<br> <br>나무보단 키가 작지만, 그보다 훨씬 지능적이고, 더 난폭한 아래 세상의 식물들.<br><br>비수처럼 날카로운 잡초들과, 칼의 잎을 달고 있는 꽃들, 그리고 뱀의 비늘을 덮고 있는 덩굴까지...<br>그것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, 계속해서 날 지켜보며, 내가 약점을 흘리는 그 순간만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.<br> <br>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.<br> <br>그것은 내가 걷고 있는 길 위로는 그 어떤 식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.<br> <br>그 저주받은 식물들은 이 오솔길에 접근하지 않았다, 아니 못 했다.<br>내 다리를 붙잡으러 오솔길로 몸을 던질 때마다, 마치 결계에 막혀 튕기듯 반대 방향으로 꺾어졌기 때문이다.<br> <br>정확힌 알 수 없지만, 오솔길 위에 듬성듬성 있는 조약돌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.<br> <br>저것들에게 죽지는 않을 거란 안도감에, 난 문득 뒤를 돌아봤다.<br> <br>내 뒤의 하얀 형상은 계속해서 날 따라오고 있었다.<br> <br>그 조약돌들이 이 형상에겐 결계 작용을 하지 않는 듯했다.<br> <br>내 그림자 옆에 서있는 하얀 그림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자니, 그 특유의 애잔함이 마음속을 아려왔다.<br>난 그 슬픈 느낌을 지우려 다시 고개를 돌리고, 돌에 비친 달빛을 따라 계속 길을 나아갔다.<br> <br> <br> <br> <br> <br>얼마나 걸었을까, 영원할 것 같던 '빛의 길'이 갑자기 끊어져버렸다.<br> <br>계속 땅만 보고 걷던 나는, 놀라 고개를 들며 주위를 둘러봤다.<br> <br>사방을 둘러보는 나의 시야 정면에 어떤 낡은 집이 들어왔다.<br><br>알 수 없는 포근함을 안겨주는 그 집은, 어울리지 않는 검은 매마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.<br>그것들은 아까의 그 저주받은 나무가 아닌, 정말로 제 생을 마감한 고목(古木)들의 흔적이었다.<br> <br>스멀스멀 올라오는 호기심이란 감정에, 난 그 허름한 집을 향해 걸어갔다.<br> <br>집에 가까워지자 정사각형 형태로 집을 둘러싸고 있는 돌무더기들이 눈에 들어왔다.<br><br>그 돌들의 무덤은 한때, 외부 세계로부터 집을 지켜주던, 담벼락의 마지막 흔적이었다.<br><br>난 과거의 영광을 잃은 그 죽은 벽을 넘어서며, 마당 안으로 발을 들였다.<br> <br>이윽고, 기분 나쁜 감촉이 발, 다리, 허리를 타고 오르며, 사각거리는 모래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.<br><br>마당엔 그 흔하디 흔한 잡초 한 포기도 없었다.<br>단지 검은 흙 위를 간간히 장식하는, 부러진 나뭇가지들만이 있을 뿐이었다.<br> <br>그렇게 마당을 지나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떡하니 날 막아섰다.<br> <br>이 집은 중세풍의 2층 구조였는데, 이상하게 1층만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손상이 없었다.<br>1층만 보면 이 집이 폐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.<br> <br>난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,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또 다른 문을 찾기 시작했다.<br> <br><br><br>다행히 집 뒤편쯤에 도달했을 때, 잠금장치가 녹슬어 있는 작은 부엌문을 찾을 수 있었다.<br><br>이어서, 난 조심스럽게 그 고장난 문고리를 돌렸다.<br><br>그러자, 부식된 금속의 소름끼치는 비명 소리와, 기분 나쁜 감촉이 귀와 손을 통해 온몸을 타고 흘러갔다. <br><br>난 그 기괴한 느낌을 떨치며, 그대로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.<br><br>집에 들어서자 나무 썩는 냄새와 곰팡이 내음이 섞인, 퀘퀘한 냄새가 코를 자극해 왔다.<br>지하실의 그것보다 더 역한 그 악취에, 난 입고 있던 셔츠를 올려 코를 막았다.<br><br>부엌 옆엔 커다란 식탁이 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, 그 위에는 아직까지도 식사를 기다리는, 4개의 접시와 4쌍의 수저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.<br><br>스테이크라도 올라갈 법한 비주얼의 그 접시들에는, 허나, 먼지밖에 담겨 있지 않았다.<br><br>난 그대로 부엌을 나와, 거실로 걸어갔다.<br><br>"뭐..뭐야..."<br> <br>거실에 들어서자, 순간,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졌다.<br> <br>거실 벽을 장식하고 있는 사슴 박제와, 고풍스러운 오래된 커튼, 그리고 불 꺼진 양초까지.<br>그것은 완벽한 중세 시대의 모습이었다.<br><br>난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며, 거실 곳곳을 둘러봤다.<br>중세 시대만큼이나 지루한 모습의 그 거실은, 박물관 같은 분위기말고는 특별한 다른 점은 없었다.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left;"> <div><br><br> <br>거실을 전부 살펴본 나의 호기심은 이어서 2층으로 그 눈길을 돌렸다.<br><br>(2층엔 뭐가 있을까?)<br> <br>난 2층을 확인하기 위해, 거실 귀퉁이에 있는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갔다.<br> <br>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들려오는 삐그덕거리는 소리와, 가끔씩 보이는 구멍 뚫린 층계가 날 불안하게 만들었지만, 난 멈추지 않고 계속 계단을 올라갔다.<br> <br>그렇게 간신히 2층에 도달하자, 뻥뚫린 천장과 거기에 담긴 밤하늘이 날 맞이했다.<br> <br>2층에 있는 단 하나의, 이 작은 방은 지붕의 반이 무너져 내려, 유령의 집 같은 기괴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.<br> <br>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대며 주위를 살펴봤다.<br> <br>반쯤 무너져 내린 이 방 안엔, 아이들이 쓸 법한 작은 침대 두 개만이 들여져 있었다.<br><br>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건지, 검은 누런빛만을 발하고 있는 침대 시트가, 사람의 손길이 끊긴 뒤의 시간의 흐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.<br><br><br>"응..? 뭐지?"<br> <br>순간, 나의 시야에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작은 책이 들어왔다.<br> <br>난 바로 침대로 걸어가, 그 책을 집어 들었다.<br> <br>누렇게 변색된 책의 표지에는 매우 서투른 글씨로 '일기장'이라 써져 있었다.<br><br>난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, 표지를 넘기고 한 장씩 한 장씩 페이지를 넘겨나갔다.<br> <br>연필로 쓴 글씨가 바래지고, 변색된 페이지에 글씨가 가려지고 해서, 도저히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, 간간히 보이는 작은 글씨들로, 난 이것이 한 자매의 공동 일기장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.<br><br> <br>난 이 방에서 살았을 그 자매와,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하며, 책을 덮고 방을 나섰다.<br> <br>그대로 계단 쪽으로 걸어가면서, 난 문득 뒤를 돌아봤다.<br> <br> <br><br>(뭐..뭐야, 왜 멈춘 거지? 더 이상 안 따라오는 건가...?)<br> <br>하얀 형상은 내 등 뒤에 있지 않았다. 그것은 침대 앞에 서있었다.<br>마치 아래에 펼쳐진 일기장을 읽는 듯, 고개를 숙인 채로...<br> <br>그 하얀 그림자는 머리, 몸통, 손, 다리만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지만, 난 확실히 그것의 행동을 읽을 수 있었다.<br>그 하얀 형상은 분명히 아래에 놓여 있는 일기장을 읽고 있었다.<br> <br>그런 그것의 모습에서, 왠지 모를 비참함이 느껴졌다.<br>그 감정에 휩쓸리며, 나 또한 마음이 쓰라려 왔다.<br> <br>그 아픈 마음을 감싸기 위해, 난 그대로 계단을 내려와 그 집을 나왔다.<br> <br>밖에는 다시 빛나는 오솔길이 펼쳐져 있었다.<br> <br>난 익숙한 그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.<br> <br>순간, 나의 시야 왼쪽 끄트머리에 익숙한 새하얀 그림자가 나타났다.<br> <br>그러자, 나도 모르게,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.<br>비록 내가 의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, 올라간 입고리만큼이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.<br> <br>그렇게 이 검은 숲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발걸음으로, 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달빛의 길을 걸어갔다.<br> <br> <br> <br> <br> <br>난 길을 걸어가면서,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기 시작했다. <br><br>"그래, 한 번 생각해보자. 정체모를 이상한 숲에, 기억은 없고, 내 뒤에선 하얀 형상이 따라오고..."<br> <br>그 중에서도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은, 바로 내 뒤를 따라오며, 이상한 서글픈 분위기를 뿜어내는 저 하얀 그림자였다.<br> <br><br>(도대체 왜 날 따라오는 거지...?)<br><br> <br>난 그 이유를 찾기 위해, 머리를 빠르게 굴리기 시작했다.<br> <br>그런 나의 머리가 내린 판단은, 일단 이것이 따라오는 이유를 알려면, 이것의 정체부터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.<br> <br><br>(하얀 빛의 사람의 형상이라...)<br> <br><br>저 하얀 그림자는 아무리 봐도, 귀신의 형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.<br>그이외에 저 존재를 설명할 다른 근거는 없었다.<br> <br>그렇다면 남은 의문점은 하나, '왜 날 따라오는가?'였다.<br> <br>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, 내 과거, 즉 기억이 필요했다.<br>그 사실은 지금은 저 귀신의 정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다른 사실로 귀결될 뿐이었다.<br> <br>그러나, 한 가지 확실한 건, 이 귀신이 날 증오하거나, 저주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었다.<br>왜냐하면,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애틋함이 느껴지는 그것이, 내 안의 이상한 보호 본능을 조금씩 맥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.<br> <br><br>난 고개를 돌려 그 애틋한 그림자를 다시 한 번 쳐다봤다.<br> <br>분명히 아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, 어쩐지 그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.<br>그 새하얀 얼굴은 왠지 모르게 한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일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.<br><br><br>그렇게 하얀 빛에 가려진 희미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, 순간, 얼굴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.<br><br>"뭐...뭐야? 얼굴이...보인다.. 설마 기억이..?"<br> <br>그 흔들거림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며, 흐릿한 이목구비에 겹쳐진, 한 여자의 얼굴이 눈 앞에 아른거렸다.<br> <br>새하얀 빛을 내뿜는 건지 아니면 그 빛을 받는 건지 모를, 희미한 그 얼굴은 어쩐지 익숙한,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.<br> <br>그 형체가 더욱 또렷해지며 여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려는 그 순간, 그녀의 얼굴이 유리 파편처럼 일그러지며, 그대로 사라져버렸다.<br></div> <div> </div> <div> <br>"화...환상이었나..?"<br> <br>내가 본 것이 한낱 환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, 머릿속이 이내 공허해졌다.<br> <br>그래도, 그 공허한 머릿속엔, 그것이 의미없는 환상일 뿐이라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다. <br>다만, 그 여인의 얼굴을 떠올리기엔, 아직 내 기억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그마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.<br><br>난 저 하얀 그림자에 관한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, 다시 그 빛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.<br> <br><br><br><br><br>얼마나 걸었을까.<br>순간, 차갑고 습한 바람이 내 귀에 불어왔다. <br><br>이어서 그 기분 나쁜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.<br><br>"뭐..뭐야?!!"<br><br>난 깜짝 놀란 두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. 고요한 숲의 풍경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.<br><br>"뭐지...?"<br><br>의구심과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로, 난 다시 길을 걷기 위해 아래의 조약돌들을 쳐다봤다.<br><br><br> <br>그런데 뭔가 이상했다. <br> <br>달빛을 받는 조약돌들은 반드시 흐릿한 금색, 내지는 하얀빛을 띠어야 한다.<br>한데, 내 앞에 있는 이 다섯 개의 조약돌들은 금색도 흰색도 아닌, 붉은빛을 발하고 있다.<br><br>이해할 수 없는 이 기현상에, 난 고개를 조금 들어 앞을 바라봤다.<br> <br>그런 나의 눈 앞엔, 붉은빛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.<br>저 멀리 언덕까지 펼쳐진 모든 조약돌들이 루비의 그 붉은색을 뽐내며, 핏빛 오솔길을 이어나가고 있었다.<br></div> <div> <br>"도..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?!!"<br> <br>난 극심한 당황감에, 고개를 더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.<br> <br>"허억..."<br> <br>하늘엔 붉은 달이 떠있었다.<br> <br>천구를 가득 뒤덮고 있던 구름은 지평선 끝에서도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.<br> <br>단지 검은 하늘 위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핏빛의 달만이 있을 뿐이었다.<br> <br> <br> <br>이윽고, 그 붉은 달이 점점 갸늘어지더니, 날카로운 타원형을 이루기 시작했다.<br> <br>내 무의식은 계속해서 그 환각과 주위의 풍경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찾아댔고, 결국 그것은 아래를 내려다 보는 누군가의 눈으로 그 형태를 바꾸었다.<br><br>붉은빛이 가득한 그 눈은 핏발이 가득 선, 포식자의 살기어린 눈동자였다.<br> <br>그것을 지각한 순간, 이성을 대신해 본능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.<br> <br>이성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환상이라고, 위험하지 않다고 게속해서 외쳐댔지만, 몸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.<br>본능은 저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라고, 살아남으라고 명령했고, 내 몸은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.<br> <br>난 앞만 보고 달려가기 시작했다.<br> <br>저 맹수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쉬지도 않고 달렸다.<br>그러나 그 눈은 결코 멀어지지 않았다. <br>멀어지긴 커녕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, 날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.<br><br>난 몸의 고통도 잊은 채, 그저 저것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쉴 새 없이 다리를 움직였다.<br><br>그러다 어느 순간, 내 앞에 또다시 빛이 끊기는 구간이 나타났다.<br><br> <br></div> <div> </div> <div> <br>빛이 있어야 할 구간에는 길이 아닌, 넓은 원형의 호수가 있었다.<br> <br>그것을 본 순간, 이성이 다시 돌아왔고, 난 달리던 다리를 강제로 멈추었다.<br>그 급작스런 제동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넘어질 뻔했지만, 난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몸을 낮추었다.<br> <br>그렇게 몇분 정도 있자,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선명해지는, 시야 사이로 호수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다.<br><br><br>검은빛을 발하는 호수는 숲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두웠다.<br> <br>그 주위엔 그때의 그 저주받은 나무들이 원형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지만, 그 나무들에게선 아까와는 다른, 알 수 없는 이질감이 느껴졌다.<br>몸통엔 군데 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, 미동도 하지 않는 말라비틀어진 가지들은 절규하는 사람의 손짓을 연상시킬 정도로 그 모습이 끔찍했다.<br> <br>아마도 이 호수의 물을 자신의 생명수로 사용한 것에 따른 대가인 것으로 보였다.<br> <br>확실히 그 검은 물은 생명이라는 단어보단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, 완전한 심연의 색을 띠고 있었다.<br> <br>난 이어서 호수 건너편을 바라봤다.<br> <br>호수의 반대편엔, 한 작은 집이 그 죽은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.<br>랜턴 하나 없는 그 집은, 그 크기와 비주얼로 보아 한 명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판자집으로 보였다.<br> <br><br>"폐...폐가인가..?"<br> <br>확실히 그 집에선 도저히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.<br>몇년간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이끼가 가득한 벽에, 문은 고장나 제 구실을 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, 안에서는 그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았다.<br> <br>이런 정보들을 통해, 내 머리는 그곳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.<br> <br>그러자 막혀 있던 안도감이 밀려오며, 긴장했던 근육들이 다시 부드럽게 이완되기 시작했다.<br> <br>"하아...괜히 놀랐네..."<br> <br>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들어올린 순간, 집 뒤의 고목이 우거진 곳에서 움직이는 어떤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.<br> <br>난 급히 손으로 입을 막고, 다시 자세를 낮추었다.<br> <br>이 정체 모를 검은 숲에서 내게 우호적인 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<br> <br> <br> <br>천천히 일렁이는 그 실루엣은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의 실루엣이었다.<br> <br>한데, 그 여자의 어깨 위로 이상한 검은 그림자가 이어지고 있었다.<br> <br>(뭘...이고 있는 거지?)<br> <br>여자는 어깨 위에 무엇인가 커다란 물건을 짊어지고, 호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.<br> <br>난 그 물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, 미간을 찌푸려 시야의 폭은 좁히되, 그 거리를 늘렸다.<br> <br> <br>(허억!!!)<br> <br>그것의 정체를 알게 되자, 소리 없는 비명이 마음속으로 새어나왔다.<br> <br>그녀가 이고 있던 것은 한 아이의 몸이었다.<br> <br>그 아이의 다리와 팔은 모두 축 늘여져, 마치 코트처럼 여자의 상반신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.<br>또한, 아이의 머리는 그 여자의 왼쪽 가슴에 엎어져 있었는데, 그 아래로 이상한 액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.<br> <br>여자가 호수에 가까워지며 달빛을 정면으로 받게 되자, 검은 실루엣이 점점 제 색을 발하기 시작했다.<br> <br>허나, 그 여자의 검은 그늘 속에서 그 액체가 조금씩 색을 나타낼수록, 나의 머리는 서서히 멈추어 갔다. <br> <br>그것은...그것은 아이의 입과 코, 그리고 눈에서 흘러내리는 피의 흐름이었다.<br> <br> <br>그 끔찍한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와중에, 박자와 음을 갖춘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.<br> <br> <br>[ 흐으응~ 흐으응~ 흐으응~ ]<br> <br> <br>그 멜로디는 기쁨에 차 흥얼거리는 여자의 콧노래 소리였다.<br> <br>이어서, 뭔가 둔탁한 것이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려왔다.<br> <br>그에 따라, 내 시선은 자연히 호수 쪽으로 돌아갔다.<br><br>(허억...)<br> <br>숨이 탁 막혀 왔다.<br> <br>여자가 어깨에 걸쳐 있던 아이를 검은 호수에 던져버린 것이다.<br><br>그 물리적 충격에 물이 요란하게 요동쳤고,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의 흔들림이 호수 전체를 뒤덮었다.<br><br>그 격렬한 파도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, 아이가 빠진 지점에서 색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.<br> <br> <br>(뭐...뭐야??!!)<br> <br>마치 물속에서 서서히 퍼지는 잉크처럼, 피의 붉은 일렁거림이 검은 물을 따라 호수 전체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.<br><br>그 끔찍한 모습에, 내 머리는 하얗게 비워졌고, 두려움을 넘어선 패닉만이 그 공간을 차지했다.<br> <br>이윽고, 저 여자에 대한 공포와, 갑자기 긴장한 근육의 끊어질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다.<br> <br><br>"흐어어억..."<br> <br> <br>빈틈없이 옥죄어 오는 심신의 압박감에, 난 결국 신음 섞인 비명소리를 내뱉었다.<br> <br>그 힘없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,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바라봤고 그 여자의 눈과 내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.<br> <br> <br> <br>검은색의 그 공허한 눈... 내 눈과 마주친 그 여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.<br>그저 끝없는 심연만이 그 날카로운 눈매 속에 채워져 있을 뿐이었다.<br><br><br>붉은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검은 숲에, 한동안 고요한 적막이 이어졌다.<br><br>그 짧지만, 긴 침묵을 깬 것은 비명 섞인 나의 목소리였다.<br> <br><br>"허아아아악!!!"<br><br> <br>여자의 눈이 이상했다... 검은색만 담긴 눈은 아까와 같았지만, 그것을 담는 눈매의 곡선이 이상해졌다.<br> <br>갑자기 그 여자의 눈이 점점 반달 모양으로 변해간 것이다.<br> <br>반달을 넘어 아치형으로 가늘어진 그 소름끼치는 눈에 이어서, 음이 심하게 갈라지는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.<br> <br> <br>[ 아가야~ 거기서 뭐하니, 어서 빨리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꾸나~ ]<br> <br>단어들의 조합만 보면, 자신의 아이를 부르는 자상한 어머니의 사랑스런 한 마디였지만, 그 멜로디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.<br>마치 먹잇감을 찾은 포식자처럼 흥분된, 그 목소리는 도저히 사람의 소리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괴기했다.<br> <br>난 그대로 몸을 올리고, 저 여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, 다리를 움직였다.<br> <br>허나, 근육이 경직된 다리는 그 지시를 받아드릴 수 없었다.<br> <br>난 인대가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에, 비명을 지르며, 앞으로 넘어졌다.<br> <br>그렇게 넘어지며 머리가 땅에 가까워져 가는 그 짧은 순간, 상하가 반전된 나의 시야에 무엇인가가 들어왔다.<br> <br>그것은 바로 내 뒤의 하얀 그림자였다.<br>그 형상은 마치 뭔가 두려운 것이라도 본 듯,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, 내 뒤에 숨어 몸을 떨어대고 있었다.<br> <br>그런 '그녀'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녀렸다, 너무나도 안쓰러웠다.<br> <br>왠지 내가 '그녀'를 지켜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<br> <br>난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, 두 발로 다시 자리에 일어섰다. <br> <br> <br> <br>[ 아가야~ 아가야~ ]<br> <br>그 여자는 이젠 갈라지는 것을 넘어서 고막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를 내며, 점점 다가오는 속도를 늘리고 있었다.<br> <br>난 호수의 오른편 길로 다가오는 그 여자를 피해서, '그녀의 팔'을 잡고 왼쪽길로 달려가기 시작했다.<br> <br>귀신의 팔을 잡았다는 사실도 지각하지 못한 나의 머리엔, 생존 본능과 보호 본능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.<br><br>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면서도, 난 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.<br></div> <div> <br>"허아아아악!!!"<br> <br>그 여자는...이젠 살기를 뿜어내는 증오의 눈빛으로 날 쫒아오고 있었다...<br> <br> <br>[ 거기 서!! 어서 이리 안 와??!!! 나중에 또 혼나려고 그러니?!!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!!! ]<br> <br>분노에 가득찬 그 여자의 목소리가 호숫가의 축축한 공기를 거쳐, 내 귀에 들어왔다.<br> <br>그 끔찍한 멜로디는 주위의 풍경만큼이나, 날 두렵게 만들었지만, 난 오히려 그 두려움에 속도를 더욱 높이며, 계속해서 다리를 움직여댔다.<br> <br>그렇게 쉬지도 않고 달리자, 어느순간부터 폐와 심장의 고통이 가슴을 지나 복부까지 이어졌다.<br>다리에서 느껴지는 혹사의 고통이,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내 전신을 찔러대기 시작했다.<br> <br>그럴 때마다, 난 내 옆의 새하얀 '그녀'를 바라보면서, 그 고통을 지우려 애썼다.<br> <br> <br> <br> <br> <br>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,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몸의 신호가 날 강제로 멈춰세웠다.<br> <br>난 그대로 쓰러지듯 자리에 주저앉으며,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.<br>다행히 그 여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듯했다.<br> <br>그러자 파도처럼 밀려오는 안도감에, 억지로 참고 있던 고통들이 더욱 극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.<br> <br>가슴이 타오르는 듯한 고통에 호흡의 리듬이 불규칙해졌고, 그에 따라 눈 앞이 아른거리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.<br> <br>그렇게 현실과 무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정신을 잃으려 하는 그 순간, 어떤 '익숙한' 목소리가 들려왔다.<br> <br> <br> <br>[ 일어나... 일어나... ]<br> <br>여인의 가녀린 목소리에 이어지는 차가운 감촉이 내 손을 감싸안았다.<br> <br>그 감촉은 온도라는 속성만 제외하면, 사람의 손의 느낌과 완벽하게 일치했다.<br> <br>그 차가운 손의 감촉에 난 정신을 차리고, 오묘한 감각이 느껴지는 내 왼손을 바라봤다.<br> <br> <br>나의 거친 손 위엔, 어떤 새하얀 손등이 포개어져 있었다.<br> <br>그것은 다름아닌 그 하얀 그림자의 손이었다.<br> <br>손등의 핏줄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, 그 손은 분명히 한 여인의 작고 고운 손이었다.<br> <br>[ 여기서 자면 안돼, 어서 일어나... ]<br> <br> <br>하얀 형상이 말을 했다... 아까 들었던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.<br> <br>보이지도 않는 입을 움직여대며, 내게 말을 거는 그녀의 목소리엔 서글픔이란 감정이 맺혀 있었다.<br> <br>"누...누구세요..? 왜 절 따라오시는 거에요?"<br> <br>나의 이 물음에, 그녀가 아까와는 다른,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.<br> <br>[ 지금은 모르겠지만, 나중엔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거야.. 늘 그래왔듯이... ]<br><br>말을 끝마친 그녀의 모습에서 어쩐지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.<br> <br>"나..나중에 알 수 있다니, 그게 무슨 소리에요??!!!"<br> <br>나의 두 번째 물음에,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.<br>대신,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갈 뿐이었다.<br><br>(도대체...이게...)<br> <br>손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감촉이 한층 더 차가워졌다.<br> <br>그러나, 그것은 결코 차갑지 않았다.<br> <br>손은 이미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시렸지만, 마음만큼은 함박눈의 그 포근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...<br> <br> <br> <br> <br> <br>『빛을 받는 모든 생명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몽환의 달.<br> <br>진한 보랏빛을 내뿜는 하늘의 어미와, 제 어미의 빛을 받아 자수정의 색을 발하고 있는 땅위의 자식들이 정처 없는 길을 알려주듯, 황홀하게 일렁인다.』<br><br> <br> <br>난 희미한 보랏빛으로 빛나는 오솔길을 따라 계속 길을 나아갔다.<br>이젠 달빛이 무슨 색으로 바뀌든, 아무렇지 않았다.<br>그저 내 옆의 새하얀 그녀와 함께, 어서 빨리 이 숲을 빠져나가고 싶을 뿐이었다.<br> <br>옆에서 아우성 쳐대는 검은 나무들과, 풀, 꽃들이 왠지 더욱 성가시게 느껴졌다.<br> <br>난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어, 제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 잿빛의 꽃을 향해, 있는 힘껏 그것을 던졌다.<br><br>돌에 치인 꽃은, 줄기가 꺾어지며 칼 같은 꽃잎을 그 위로 흩뿌렸다.<br> <br>그 아름답지만, 잔인한 모습이 뇌리에 강하게 박히며, 내게 알 수 없는 익숙한 희열을 느끼게 해주었지만, 난 그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.<br><br>(어디서 까불고 있어...)<br> <br>이 숲의 풍경에서 처음 느꼈던 두려움과는 상반된 감정이 머릿속을 가득 메어왔다.<br> <br>나의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했다는 희열에, 왠지 이 숲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, 기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, 난 다리를 더욱 빨리 움직여댔다.<br> <br>그 작지만, 빠른 걸음이 언덕을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순간, 발걸음이 서서히 느려지더니, 이내 완전히 멈추어버렸다.<br> <br> <br> <br>"뭐...뭐야, 이런 곳에 왜 저런게 있는 거야..?"<br> <br>내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. <br> <br>숲에 둘러싸인 들판엔, 주위의 검은 숲을 압도하는, 고귀한 디자인의 대저택이 서있다.<br><br>그 규모는,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빛만으로도 주변의 숲을 환하게 비출 정도다.<br><br>저택의 문 앞에서 그 빛의 길을 끝내고 있는 보랏빛 조약돌들은, 마치 지금까지의 길이 원래부터 저 대저택을 향한 것이었다고 내게 말하는 듯하다.<br><br> <br> <br>난 그 호화로운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.<br> <br>저택의 그 기풍 있는 디자인은 현관에서도 끝나지 않았다.<br>내 키의 두 배나 되는 높이의 문은, 그 테두리가 금으로 뒤덮여 있었으며, 중앙에는 칼로 새겨진 듯한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.<br> <br>(와...이게 다 뭐야...)<br> <br>누군가의 손에서 탄생했을 그 그림의 세계는, 거대한 보름달이 떠있는 것으로 보아 밤의 풍경인 듯했다.<br><br>그 밤의 세계 속에는, 늑대 두 마리가 각각 양쪽의 절벽에서 대칭을 이루며, 중앙의 보름달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고, 그 만월 위에는 까마귀 세 마리가 앉아 있었다.<br> <br>(뭐..뭐야?!!)<br> <br>순간 데칼코마니의 중심인 보름달이 반으로 갈라지며, 끼이익거리는 그 비명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다.<br><br> <br> <br>열린 문 안에서 나타난 것은, 하얀 샤워 가운을 걸친 한 여인이었다.<br> <br>"저...저..."<br> <br>이런 숲속에서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, 그 여인의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외모에, 난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다.<br><br>"기...기..길을..."<br> <br>이제 막 샤워를 끝마친 젖은 생머리가 그녀의 앳된 순수함을 대변하고 있었지만, 그 매력적인 눈매에 담긴 푸른 눈동자는 이상한 유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.<br><br>"혹시 숲에서 길을 잃으신 건가요..?"<br> <br>그보다 더 여성적일 수 없는 그녀의 목소리, 그 황홀한 음에 순간 마음을 놓아버릴 뻔했지만, 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대화를 이어나갔다.<br> <br>"네... 숲에서 나가려고 길을 따라 걷다보니,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.."<br> <br>그녀가 내게 조금 다가오며, 은은한 여인의 향기를 풍겨댔다.<br> <br>"아, 그렇군요. 이 숲이 길이 좀 복잡하고 다듬어지지 않아서, 사람들이 길을 자주 헤매요."<br> <br>젖은 긴 머리가 불편한지, 그녀가 머리를 한 쪽으로 넘기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.<br> <br>"밤중에 숲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해요. 나가려면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하기도 하고요. 괜찮으시다면 게스트룸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셔도 되는데..."<br> <br>그녀의 말 뒤에 이어지는 야릇한 분위기에 압도되어,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'네'라는 말이 흘러나왔다.<br> <br> <br> <br>그렇게 안으로 들어서자,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.<br> <br>"사실 지금 막 저녁을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,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, 뭐라도 좀 드셔야 하지 않겠어요?'<br> <br>말을 마친 뒤, 그녀가 내 손을 잡은 채로, 날 어딘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.<br> <br>그렇게 내가 도착한 곳은 연회장에서나 볼 법한 크기와 비주얼의 식당이었다.<br>그 넓고 높은 공간엔, 새하얀 천을 두른 기다란 식탁이 중앙에 서있었고, 갖가지 음식들이 특유의 하모니를 이루며 그 위를 장식하고 있었다.<br> <br> <br> <br>"자, 어서 앉아요." <br> <br>서로 마주보며 앉은 자리엔,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와 처음 보는 보랏빛의 와인이 차려져 있었다.<br> <br>"한 잔 해요."<br> <br>그녀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, 자신의 자리에 있던 와인잔에 입을 마추기 시작했다.<br>보랏빛 와인이 그녀의 입술을 어루만지며, 입 안으로 흘러들어 갔다.<br> <br>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의 시야 아래엔, 어느샌가 와인잔이 쥐어져 있는 왼손이 나타나 있었다.</div> <div>그 왼손이 천천히 올라오며, 고개가 젖혀졌고, 보랏빛 액체가 입술, 이, 혀를 차레로 거쳐 갔다.<br><br>내 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기에, 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.<br><br>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가며,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맛이 혀를 감싸안아 왔다.<br>그 뒤에 이어지는 향수인지 과일인지 모를, 향내가 코를 천천히 자극해 왔다.<br><br>그 황홀한 감각으로 서서히 감기는 나의 눈에, 내게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.<br> <br><br>"어때요? 맛과 향이 참 좋죠?"<br> <br>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파랗지 않았다.<br>하늘의 달보다 더 짙은, 검은색에 가까운 보랏빛의 그 두 눈은 너무나도 강렬했다.<br> <br>"날 따라와요."<br> <br>그녀가 등을 돌리며,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다.<br>그러자,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몸이 움직이며, 자아를 잃은 그 몸뚱아리가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.<br> <br> <br> <br>"여기가 제 침실이에요, 어서 들어와요."<br> <br>그녀가 한 쌍의 날개 문양으로 장식된 문을 열며, 그 안으로 들어갔다.<br>이어서, 내 몸도 자연히 그녀를 따라 방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.<br> <br>내 몸이 방에 다 들어서자, 그녀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, 입고 있던 하얀 가운을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.<br> <br>그와 동일한 박자로, 뒤에서는 서서히 닫히는 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. <br> <br>그럴수록 내 의식은 점차 사라져 가며, 앞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.<br><br> <br>그녀의 옷이 반쯤 내려가며, 이젠 하얀 실루엣만이 아른거릴 정도로 의식이 희미해졌을 때,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. <br> <br> <br> <br> 〔 후우~ 〕<br> <br> <br>누군가 바람을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, 방안의 모든 불이 한순간에 꺼져버렸다.<br><br>방안에는 완전한 어둠이 내렸지만, 그와는 대조적으로 내 의식은 한 없이 밝아져 갔다.<br> <br>그렇게 의식이 돌아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각한 그 순간, 내 옆에서 빛이 나타나며, 여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.<br></div> <div> <br>[ 끼야아아악!!! ]<br><br>난 비명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.<br></div> <div> <br>"허억... 뭐..뭐야??!!!"<br> <br> <br>악마...그곳엔 악마가 있었다.<br> <br>까마귀의 날개를 달고, 보라색 눈동자로 날 노려보는 검은빛 나체의 한 여자.<br>그 여자, 아니 그 악마는 방금 전까지 나랑 함께 있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.<br> <br> <br>[ 거의 다 했는데... 거의 다 했는데... 니 년이 또 방해를!!! ]<br> <br>찢어지듯 날카로운 그 목소리의 방향은 내가 아닌, 내 왼쪽을 향하고 있었다.<br> <br>난 다시 고개를 돌려, 빛이 느껴지는 왼쪽을 바라봤다.<br> <br>그 새하얀 빛은 내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오던 그녀의 빛이었다.<br> <br> <br>[ 니 년이... 니 년이 감히!!! ]<br> <br>검은 악마가 제 어깨의 날개를 펄럭이자, 검은 깃털과 함께 불어오는 엄청난 바람이 뺨을 때려댔다.<br><br>그에 지지 않고 내 옆의 그녀는 제 빛을 더욱 밝게 퍼뜨렸고, 검은색의 공간은 이내 그녀의 순수한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.<br><br>그 찬란한 눈부심에, 난 눈을 감았고, 누군지 모를 여인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들으며, 서서히 의식을 잃어 갔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어느 순간, 감긴 눈 앞으로 느껴지는 빛과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에, 난 눈을 떴다.</div> <div>그런 나의 눈 앞엔, 하얀 그림자가 서있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, 그녀를 향해 입을 열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"저..저기 감사합니다..."</div> <div> </div> <div>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며,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.</div> <div> </div> <div>그녀의 손이 향한 곳엔, 낯익은 조약돌들이 있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푸른 달빛을 받아 흐릿한 하늘색으로 빛나는 조약돌들이, 천구의 끝을 향해 흐르는 강물처럼,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있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그런 오솔길의 끝, 지평선 어딘가에서, 별처럼 빛나는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"서..설마? 드...드디어..!!!"<br> </div> <div>별을 닮은 그 빛들은, 밤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,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이상한 여자들도, 저주받은 검은 식물들도 더 이상 없었다.</div> <div>광할한 평야엔 그저 '달빛이 내리는 오솔길'만이 흐릿하게, 그러나 화려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난 내 옆을 따라오는 그녀와 함께, 그 달빛의 흔적을 밟으며 하염없이 뛰어갔다.</div> <div> </div> <div>뺨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고, 도시의 빛이 가까워질수록, 그녀의 빛은 희미해져 갔지만, 반대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져 갔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"아아...아아..."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그녀의 얼굴이 보인다. </div> <div>어깨까지 오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생머리에, 한 마리의 양처럼 순한 그 얼굴...</div> <div>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미소가 더 짙어질수록, 내 안의 기억들도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온다.</div> <div> </div> <div>허나, 기억의 파편이 조금씩 맞춰지며,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 갈수록, 나의 발걸음은 서서히 느려져 갔다.</div> <div> </div> <div>마침내, 다리가 멈추어 더 이상의 바람도 느껴지지 않을 때, 난 땅을 밟고 서있을 수가 없었다.</div> <div>난...자리에 엎어져 소리 내어 울 수밖에 없었다..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기억이 돌아왔다... 내 마지막 기억의 그림이 눈 앞에서 그려진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보름달이 뜬 밤, 달빛만이 비추는 검은 방, 그 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돌, 돌을 따라 흐르는 붉은 피...</div> <div> </div> <div>쓰러져 있는 소녀의 실루엣, 그 옆에 서있는 한 여인의 그림자...</div> <div> </div> <div>죽어 있는 나의 동생, 그녀를 죽인 새엄마...</div> <div> </div> <div>나의 사랑스러웠던 여동생...그레텔..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고요하게 그 끔찍함을 담아내는 그릇된 인물화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더니, 그 뒤의 기억이 새로운 그림을 이어갔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새로운, 1인칭 시점의 그림엔, 피 묻은 손과, 쓰러져 있는 한 여인, 그리고 정면에서 주인공을 쳐다보는 악마가 담겨져 있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그 잔인한 그림이 한 순간에 사라지며, 슬픈 눈으로 날 바라보는 그레텔의 얼굴이 보였다.</div> <div>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서글픔의 감정에 동화되며, 내 시야가 점차 눈물로 얼룩져 가기 시작했다. </div> <div> </div> <div>"흐흑... 동생아...흐흐흑... 그레텔..."</div> <div> </div> <div>내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그녀의 눈가에도 투명한 물방울이 맺힌다.</div> <div> </div> <div>한 동안 그곳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물방울은, 제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 하고 하염없이 흘러내려, 그 흐름의 흔적을 목까지 이어간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[ 오빠... 이제 가자... ]</div> <div> </div> <div>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나의 시야에, 문득 등 뒤의 검은 숲의 풍경이 들어왔다.</div> <div> </div> <div>기억이라는 그림을 검은색 잉크로 뒤덮어주는 그 망각의 숲..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지만, 힘없는 내 손은 이내 그녀의 손을 빠져나와 허공에서 흔들거렸다.</div> <div> </div> <div>그 흔들리는 손 만큼이나, 갈등하는 나의 마음이 곧 어느 한 방향을 선택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[ 오...오빠.. 안돼... ]</div> <div> </div> <div>그녀를 등지며 걸어가는 내 앞에, 날 막는 듯한 푸른 달이 비춰졌다.</div> <div> </div> <div>저 푸른 달과 내 눈이 몇번을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다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검은 숲을 향해 걸어갈수록, 감정을 짓누르던 기억들이 서서히 사라져 간다.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사라져 간다.</div> <div> </div> <div>마지막으로 그녀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쯤, 난 걸음의 속도를 줄였다.</div> <div> </div> <div>허나, 그 걸음을 멈추진 않았다.</div> <div> </div> <div>달빛에 가까워지며 서서히 짧아지는 내 그림자 뒤로, 그 '하얀 그림자'가 이어질 것을 알기에, 난 '또다시' 그 검은 숲에 발을 들인다...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 <div>-끝-</div> <div> </div> <div> </div></div>
끔찍한 기억을 간직한 채 잔인한 현실로 돌아오는 것과, 감당할 수 없는 기억을 지우며 망상 속에 빠져 사는 것 중에,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?
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.